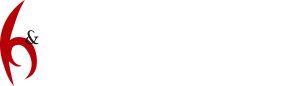회원권뉴스
"퍼팅의 묘미란 이런 것"…'그린피'의 가치를 알려주는 골프장
- 작성일2022/12/19 16:10
- 조회 149
대한민국 '시그니처 홀'
(23) 티클라우드CC
비체코스 8번 홀(파3)
소요산 아름다움 그대로 담아
해발 400m…구름 위에서 티샷
티잉 구역 서면 시야 탁 트여
집중력 방해할 정도의 절경

박동휘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티클라우드CC 비체코스 8번 홀(파3)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골프 번뇌’란 말이 있다.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골퍼도 지름 4.3㎝짜리 공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 맨다. 필드에 나갈 때마다 어김 없이 찾아오는 자괴감에 ‘다시는 골프 안 친다’는 말을 되뇌인다. 그림 같은 풍광과 마음 맞는 동반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골프는 어찌 보면 ‘사서 고생하는 바보 같은 운동’이다.
경기 동두천의 소요산 자락에 자리 잡은 티클라우드CC는 골퍼들을 그나마 번뇌에 덜 시달리게 해주는 골프장임에 틀림없다. ‘한가로이 거닐다’는 뜻을 가진 소요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린 절경 덕분에 미스샷을 쳐도 마음이 덜 다친다. 비체코스 8번홀(파3)은 그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홀이다. 구름이 발 아래 깔린 날, 해발 400m에 닦아놓은 티잉 구역에서 만산홍엽(萬山紅葉)을 볼 수 있다면 굿샷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소요산을 한눈에, 구름 속의 티샷
최대 길이 6452m인 티클라우드CC는 해밀코스와 비체코스 등 18홀로 구성돼 있다. 해밀은 ‘비 온 뒤에 맑게 갠 하늘’이란 뜻의 순우리말이다. 비체는 ‘자연의 빛이 머무는 곳’이란 의미다.
비체 8번홀은 시그니처홀이 갖춰야 할 모든 걸 담은 홀이다. 먼저 경치. 이래저래 꾸미지 않고 원래 있던 숲 안에 그린만 그렸는데도 멋진 풍경이 됐다. 티잉 구역에 오르니 왜 골프장 이름을 ‘구름 위의 티샷’으로 달았는지 알 것 같다.
만만치 않은 난도도 이 홀을 티클라우드CC의 ‘얼굴’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이 홀 티잉 구역에 서면 눈이 시원해진다. 시야가 탁 트이니, 마음껏 휘둘러보자는 유혹에 빠진다. 이날 깃대는 화이트티에서 156m 떨어진 지점에 꽂혀 있었다. 경사가 급한 내리막 코스. ‘라운드 매니저’(이곳에선 캐디를 이렇게 부른다)는 “125m 정도 치면 된다”고 했다. 9번 아이언을 꺼냈다. 좌우 폭이 40m나 되는 긴 타원형 그린인 만큼 ‘원 온’이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평소 치던 대로 휘둘렀는데 왼쪽으로 감겼다. 이 홀에 오기 전 16개 홀을 도는 동안 아이언 샷만큼은 똑바로 나갔는데, 풍경을 감상하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졌나 보다. 공은 그린 왼쪽에 떨어졌다. 공이 놓인 위치를 보자마자 ‘파는 물 건너갔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핀까지 45m나 떨어진 데다 내리막 경사여서다.
피칭 웨지로 러닝 어프로치를 시도했으나 공은 여지없이 그린을 벗어나고 말았다. 시쳇말로 운동장을 넓게 썼다. 더블보기. 90타를 넘기지 않으려 그렇게 기를 썼는데, 17번째 홀에서 무너졌다.
○그린 플레이의 묘미 알려주는 골프장
구력이 짧은 골퍼들은 티클라우드CC의 최고 매력을 경치로 꼽지만, 경험이 풍부한 골퍼는 그린을 첫 손에 꼽는다. 18개 홀의 그린 스피드가 모두 3.0m(스팀프 미터 기준) 이상이어서다. 홀별 스피드 차이가 15㎝에 불과할 정도로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티클라우드CC가 송추CC, 일동레이크CC, 서원밸리CC 등과 함께 ‘수도권 북부 최고 명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일등 공신이 바로 그린이다.
함께 라운드한 박성준 티클라우드CC 코스관리팀장은 “오늘 회원들에게 공지한 그린 스피드는 3.2m였지만 실제로는 3.4m 정도 된다”고 했다. 일반적인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 스피드가 2.5m 안팎인 걸 감안하면, 대리석 위에서 공을 굴리는 셈이다. 그만큼 그린 관리에 열과 성을 다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명문 구장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린피(green fee)’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나. 명문 클럽은 골프장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그린 관리에 쏟는다고 한다.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 바로 그린피다.
상당수 골퍼는 드라이버샷에 목숨을 걸고, 그린 위에선 설렁설렁 플레이한다. 홀과의 거리가 한참 먼데도 동반자들은 ‘오케이’를 주고, 대다수 골퍼가 덥석 받는다. 그린을 즐기지도 않았는데 그린피를 내는 셈이다.
티클라우드CC의 그린은 앞뒤로 큼지막하다. 1990년대 초 골프코스 설계자 이재충 씨가 만들었을 때는 두 개의 그린이었는데 2000년 초반에 하나로 합쳤다. 일각에선 그린이 커졌다는 이유로 난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거꾸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박 팀장은 “평일엔 화이트티 기준 6200m 정도로 세팅한다”며 “모든 채를 써야만 레귤러 온이 가능한 데다 그린이 워낙 빨라 롱퍼팅보다 어프로치샷이 유리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해밀코스 7번홀(파4)이 그런 홀이다. 위아래 폭이 65m에 달하는 초대형 그린이 3단으로 펼쳐져 있다. 잔잔한 바닷가 너울을 닮았다. 정길연 티클라우드CC 대표는 “샷과 퍼팅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티클라우드CC의 원칙”이라고 했다.
티클라우드CC는 연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골프장이다. 운영사인 hy(옛 한국야쿠르트)는 2009년 다이너스티CC를 인수한 뒤 회원이 직접 와야 라운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회원의 80%가량은 법인이다. 10대 그룹 중 한화만 빼고 모두 회원권을 갖고 있다. 그만큼 ‘비즈니스 라운드’ 하기에 좋은 골프장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